심청가 인당수 빠지는 데, 정권진 창, 이정업 북 (4:52)
고시래!”
고사를 다 지낸 후으,
“심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허니, 심청이 죽으란 말 듣더니,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데 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디,
“도화동이 저기 운애만 자욱헌 디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이는 추호도 생각마옵시고,
어서 어서 눈을 떠 대명천지 다시 보고 칠십생남허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십만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가시거든 우리 부친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글랑은 염려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라!”
【휘몰이】 심청이 거동 봐라.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초마 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루,
만경창파 갈마기 격으로 떴다 물에가 풍!
【진양】 빠져 놓니, 행화는 풍랑을 쫓고 명월은 해문에 잠겼도다.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 화장이 모두 운다.
“장사도 좋거니와 우리가 연년이 사람을 사다가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
“닻 감어라, 어기야 어야어야.”
우후청강 좋은 흥을 묻노라 저 백구야,
홍요월색이 어느 곳고?
일강세우 네 평생에 너는 어이 한가허느냐?
범피창파 높이 떠서 도용도용 떠나간다.
심청가 인당수 고사, 박봉술 창, 신쾌동 북 (8:13)
【자진몰이】 한 곳을 당도허니 이난 곧 인당수라.
광풍이 대작하고 벽력이 나리난 듯, 어룡이 싸우난 듯,
대천 바다 한가운데 노도 잃고, 닻도 끊고, 용총도 잃고, 키도 빠질 듯,
바람 불어 물결 쳐 안개 뒤섞어 자자진 날으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점글어 천지적막허고,
가치뉘떠 뱃전 머리 탕탕 경각으 위태하니,
도사공 영좌 이하 황황대겁하야 고사기계를 차리난디,
섬 쌀로 밥을 짓고, 큰 톳 잡고,
동우 술, 삼색 실과, 오색 탕수으 방위 갈라 채려 놓고,
도사공이 북채를 양 손으 갈라 쥐고,
【아니리】 고사를 하는디,
사해 용왕님이 감동하게 하난 고사여든 오직 잘할 리가 있겠느냐.
【자진머리】 북을 두리둥 둥둥둥둥, 두리둥 둥둥둥둥,
두리둥 둥둥둥 울리더니 고사를 헌다.
“헌원씨 배를 무어 이제불통헌 연후에
후생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허니 막대한 공 아니며,
하우씨 구년지수 배를 타고 다사렸고,
오복에 정한 공세 구주로 돌아들 제, 배를 매고 기다렸고,
공명으 탈조화는 동남풍 빌어 조조으 십만대병 주유로 화공허니
배 아니면 어찌하며,
임술지추칠월 종일위지소요하야 소동파 놀았고,
지국총 어사화, 계도난이화장포난 경세우경년으 상고선이 그 아닌가?”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 뚝 끈치더니,
도사공이 심청을 물그러미 보더니마는,
“인정은 박절허나 어쩔 수가 없구려.
여보, 심낭자, 시가 늦어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을 허니, 심청이 기가 막혀, 벌떡 일어서더니마는
“여보시오 선인네들 동서남북은 어디며, 도화동은 어디 만큼이나 있소?”
도사공이 손을 들어 가르치난디,
“동은 여기요, 남은 여기요, 서는 여긴디, 북은 여기라.
도화동은 저기저기 운애만 자욱허고,
메아지구름이 담담 떠들어가는 디가 저가 도화동이요!”
심청이 기가 맥혀,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니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만물을 보옵시고,
좋은 디 장가들어 생남하야, 불효여식 청이는 생각지 마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네들 내내 평안하옵시고,
억십만금 퇴를 내어 고국으 가는 길에 이 물어 지내거던
나의 혼백 넋을 불러 물밥이나 하야주오!”
“글랑은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심청이 기가맥혀 뱃전을 부여잡고 벌렁벌렁 떠는 양은 사람 치고는 못 볼레라.
“내가 이게 웬 일이냐. 부모를 위하야 일정지심 두 마음이 왜 있으리.”
영채 좋은 눈을 감고 추매폭을 무릅씨고 앞니를 아드득 갈며,
바람맞은 병신처럼 이리 비틀비틀,
창해 몸을 주어 만경창파 갈매기 첨으로
떴다 물에가 풍! 거품이 부르르르르르.
【아니리】 묘창해지일속이라.
【진양】 행화는 풍랑을 쫓고, 명월은 해문에가 잠겼더라.
영좌도 울고, 이하도 울음을 울고, 적군, 화장이 모도다 울 적에,
“아차차차 심소제야! 불쌍허구나 심소제야,
늙은 부친 눈 어둔 것이 평생으 한이 되야 이 죽엄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연연이 사람을 사다가 이 물에다가 제숙을 허니 우리 후사가 잘 되겼느냐?
명년부텀은 이 장사를 고만 두자.
닻 감어라. 어기야 어기야 여기여 어기야.”
수렁술렁 남경으로 떠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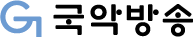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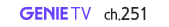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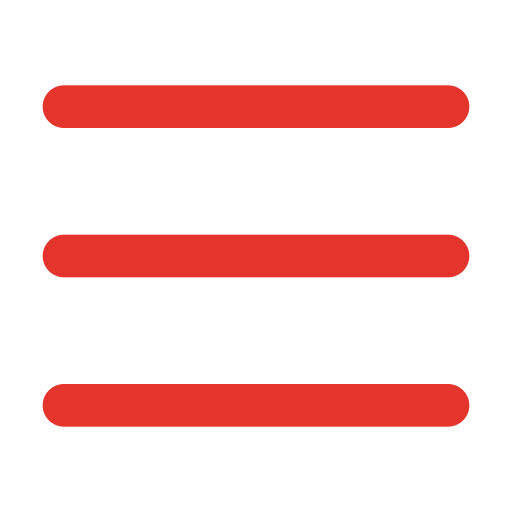

 월~금 | 16:00 ~ 17:55
월~금 | 16:00 ~ 17:55





